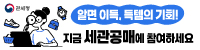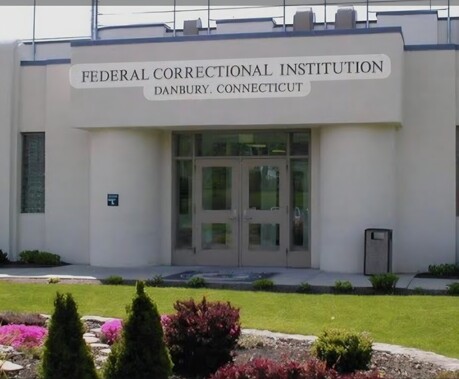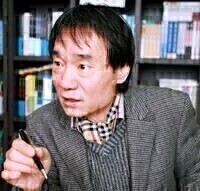
필자는 박사학위논문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에서, 학계 최초로 ‘문화영토론’에 영토권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 규명을 위한 기본이론으로 도입했다. 필자가 정립한 ‘문화영토론’은 일반적으로 문화가 영토라고 말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문화영토’가 아니다. 문화와 역사와 영토의 상관관계를 도출해서 구축한 이론으로, 학위논문에 기본이론으로 적용한 이후로도 꾸준히 연구를 거듭해서 보완한 이론이다.
문화는 이 순간에 인류가 행하는, 보편성과 상속성이라는 사회성이 동반된 모든 사고와 행동이다. 사회성을 갖추지 않은 것은 일부 개인들의 일탈일 수도 있으므로 문화라고 정의하려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 중에서도 일정한 영토에 고유하게 형성되어 대를 이어 발전하며 상속되어 그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된 문화가 ‘영토문화’로, 순간순간의 영토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것이 역사다. 따라서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와 역사는 그 영토에서 생활하던 민족이나 나라의 백성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역사의 주인이고 영토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영토론’이다.
즉,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하여 영토분쟁지역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를 영토문화로 규정한 이유는,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일부 유적이나 유물을 이용해서 문화에 의해 영토권을 규명한다고 하다가는 전래 된 외래문화나, 침략자가 인위적으로 전래시킨 왜곡된 문화에 역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영토론’을 활용하여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토 특성에 의해 서로 다르게 형성된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정립한 ‘영토문화론’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고 했는데, 문화주권자를 정의(定義)할 수 있는 이론이 ‘영토문화론’이기 때문이다.
‘영토문화론’은, ‘문화영토론’과 연계하여 영토권 규명을 위한 이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가 학계 최초로 정립한 이론이다. 문화가 영토라는 일반적인 개념만 가지고 영토권 규명을 위한 실례로 아무 문화나 활용하면 안 된다.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유일하게 필요한 문화는 ‘고대부터 농경・정착 사회에 걸쳐 일정한 영토에 정착한 민족이나 나라의 백성들이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 전수하며 발전시켜, 고유성과 상속성을 갖고 그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영토와 운명을 같이하는 유・무형의 모든 문화로, 그 영토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문화’다. 필자는 그러한 문화를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라고 명명하여, 학계 최초로 ‘영토문화’라는 용어를 설정하고 개념과 특성 및 분류, 활용 방법 등을 비롯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영토문화론’은 ‘영토문화’를 활용하는 이론으로, ‘영토권 분쟁이 야기된 영토 주변에, 분쟁이 야기된 영토와 비슷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모든 영토의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본질을 정립함으로써, 분쟁지역과 동일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나 나라를 영토권 분쟁지역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로 규명하는 과업’으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필수 이론이다.
‘영토문화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토문화를 분류해야 하는데, 유・무형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영토의 특성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는 그 영토의 기후, 지형 등에 따라서 형성되어 일반적인 문화에 비하면 그 범위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인 문화를 분류하는 것과는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대에 매장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의 영토문화를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분류되는 것은 매장문화라고도 하는 장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고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장례 풍습을 알 수 있고, 옷이나 장신구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고, 시신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체구 등을 유추하여 그 시대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티베트의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문화를 통해서 얻는 영토문화가 극히 제한된다. 그들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매장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해체해서 독수리 먹이로 주는 조장이나, 강에 빠트려 물고기 밥으로 주는 수장을 통해서 시신을 남기지 않으므로 묘지가 없으니 유물 자체를 같이 묻지 않기 때문에, 장례문화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는 영토문화가 무형문화인 조장과 수장의 풍습뿐이다. 매장문화가 발달한 영토에서 유물에 의해 많은 영토문화를 분석하는 것과는 다르게, 장례문화를 통해서 분석할 영토문화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영토의 특성에 따라 영토문화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토문화론’을 동반하는 ‘문화영토론’은 문화와 역사와 영토의 상관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영토문화와 역사의 주체를 규명하여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정의해서 영토권자로 규명함으로써,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왜곡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영토문화를 역사와 함께 영토권자 규명에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