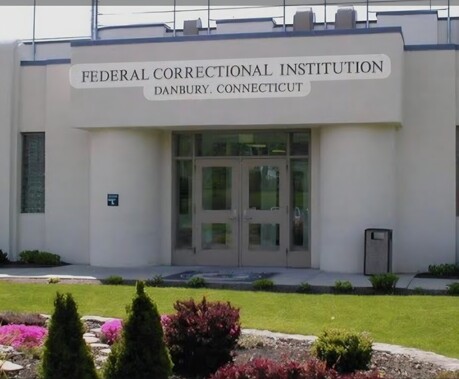화면 아래쪽, 연초록 바탕 위에는 길고 수직적으로 뻗어 있는 논길이 나타난다. 땅 위에 흩어진 꽃, 줄기, 씨앗들과 함께 구성된 이 풍경은 농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다층적인 감각을 자아낸다. 화면은 하나의 평범한 농촌의 풍경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의도된 배치를 통해 다양한 방향성을 암시하며 보는 이에게 여러 갈래의 길을 제시한다.
그 길들은 가까운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때로는 흰 여백 속으로 스러지듯 사라진다. 색채에 의해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길들은 인간의 흔적, 삶의 이동과 선택의 궤적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작가에게 이 길들은 단지 지리적 의미를 넘어서, 삶의 방향과 내면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걷는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감동을 준다. 인간은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결국 그 길은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서 대지에 새겨지게 된다.
나의 어린 시절, 고향에서 거대한 들녘을 마주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말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색채와 질감이 혼재된 그 들녘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대한 폐처럼, 무언가를 품고 밀어내는 움직임은 자연 그 자체의 리듬이자 생명력이었다. 특히 들녘이 가진 물성과 색은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관찰자의 몸과 시선을 끌어당기며 마치 감각 전체를 흡수해 버릴 듯한 공간이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체험되는 그 장면은 작가의 작업 속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경험은 화면 속 풍경을 구성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자연의 재현이 아닌, 기억과 감정이 중첩된 풍경—그것이 작가의 화면에 담겨 있다. 자연은 화면 속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닌 주체로서 존재하고, 길은 그 자연 위를 지나는 인간의 흔적, 삶의 움직임을 상징한다. 이러한 조형 언어는 작업실의 풍경과 고향의 기억,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 서로 어우러지는 지점을 형성한다.
결국, 화면 위에 펼쳐진 연초록의 평온과 길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장소를 넘어선, 기억과 삶의 궤적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호흡하는 하나의 세계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언제나 나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쯤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