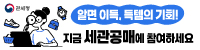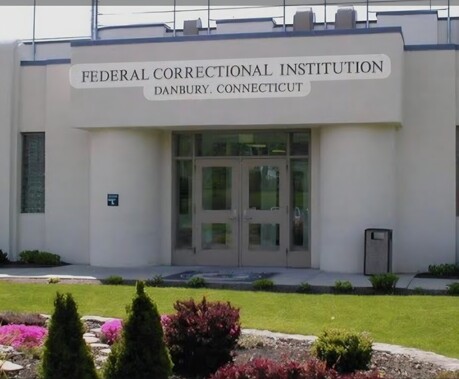‘May Day’, “Mayday Mayday Mayday”
 |
|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활동은 특히 정당·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라는 노동의 성격을 갖는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이 부인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근무환경의 변화는 경찰노조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성과연봉 퇴출제로 대대적인 공무원 인원감축 강행 등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신분불안과 불공정한 인사, 낮은 봉급 등 열악한 처우는 경찰공무원의 급속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실적에 대한 압박감, 매연이 가득한 거리에서의 교통정리, 흉기를 든 흉악범과의 대치 등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자살하는 경찰관, 퇴직 후의 사망률이 타 공무원 직군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과 직업적 스트레스, 신변 비관 등 직무와 관련해 자살한 경찰이 2014년 박남춘 의원에 의해 5년간 38명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경찰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과도한 업무에 처해 있어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게 한다.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취약하다. 정부가 보기에 경찰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대단히 편리하면서도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헌법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은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되고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경찰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을 취하며 축하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