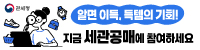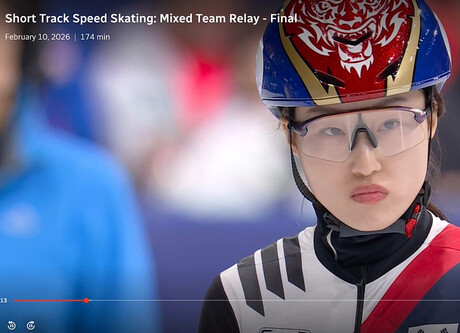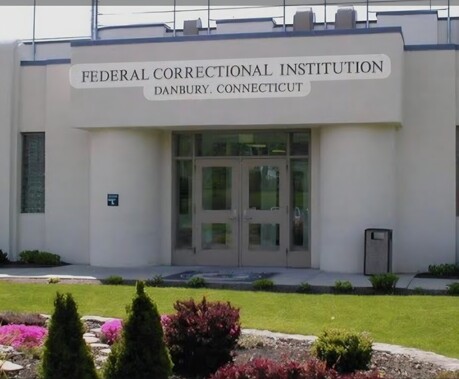|
| ▲ 신재영 칼럼니스트 |
사실 본지 칼럼에서도 지난달 필자가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 50%에다 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로 치솟아 징벌적 수탈 세금으로, 조속히 세율 인하를 서둘러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다 대주주 할증과세 20%를 적용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율로 꼽힌다.
◆ 2023년 싱가포르에만 1000억 자산가 204명 이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9308명으로 2022년 2만8690명에 비해 2.1% 늘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04명으로 2022년 10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싱가포르로 떠난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이 1000억원을 웃도는 거액 자산가로 알려졌다.
슈퍼리치들이 싱가포르로 옮기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없다. 세금 지옥이나 다름없는 한국과 비교하면 천국인 셈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수당인 야당에 부딪혀 뜻을 펴지 못했다.
징벌적 상속증여세법이 생긴지 24년이 넘었다. 하지만 세율 완화 개정은 하세월이다. 상속증여세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도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요즘 싱가포르엔 한국인 자산가의 이민과 재산 이전을 도와주는 패밀리오피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로펌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행을 택하는 대자산가는 보통 1000억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지에 패밀리오피스를 차리고 금융전문가를 직접 고용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유명 컨설팅업체는 올해 금융자산만 100만달러를 넘는 한국 부자 1200명이 싱가포르를 포함해 상속세가 없거나 부담이 낮은 캐나다, 호주,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싱가포르로 국적을 취득한 대자산가가 이미 204명에 이른다. 이들이 1인당 50억원을 이전했다고 가정하면 도합 1조원에 달하고 1인당 100억원이라면 2조원을 웃돈다. 부의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경영노하우 및 뛰어난 기술 이전까지 따지면 아찔할 지경이다.
◆ 세율 60% 폭탄…중산층도 과세 대상 3년 새 2배
고액 자산가의 해외 ‘상속 피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5% 증가했다.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대상자가 두 배가량 늘었다. 2005년 0.8%에 불과하던 과세자 비율은 2023년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7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17배가량 뛰었다. 서울 거주자로 한정하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14%에 육박해 7명 중 1명은 상속세를 내는 셈이다.
현행 제도상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40%가 1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올해 평균 매매가격은 13억원에 달한다. 중산층 거주지로 꼽히는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0억원에 근접했다. 상속세 부담이 더 이상 과거처럼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1997년 상속세 공제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된 당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시세는 2억7000만원을 오갔다. 같은 주택형의 최근 시세는 25억원 안팎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2000년 45%에서 50%로 인상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으면 20%, 5억원 초과 3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면 50%의 상속세율은 그대로다. 때문에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는 부자유치 경쟁, 한국 투자이민은 '유명무실'
세계 각국은 부자유치를 위해 투자이민 정책을 대폭 개선해 부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도 투자이민제를 활용해 자산가의 유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다. 규제와 부담많은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 자격(F-5) 비자를 얻은 외국인은 지난해 212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1009명)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2010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됐다. 국내 투자이민 대부분은 제주도에 쏠렸다. 최근 5년 투자이민자 중 80%가량이 제주도로 이민한 중국인이었다. 동부산관광단지, 알펜시아, 정동진 등의 유치 실적은 0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난개발, 부동산 지가 상승, 범죄율 상승 등을 문제 삼은 부정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적용 지역을 대폭 축소했다. 2013년 4531억원에 달하던 유치 실적은 2016년 약 1493억원, 2019년 31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외국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갈수록 늘면서 부(富)의 유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1만5200명, 영국 9500명, 인도 4300명에 이어 세계 4위다. 부유층 순유입이 많은 국가는 UAE(6700명), 미국(3800명), 싱가포르(3500명) 순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 과세 구간 조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지만 ‘부자 감세’ ‘세수 부족’ 공방에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을 없애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제는 야당이다. 언제까지 ‘부자감세’라는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람도 돈도 다 떠나고 나면 어쩌자는 건가. 버려진 나라, 버려진 땅엔 봄이 오지 않는다. 곳간이 텅텅빈 나라에 여당과 야당의 존재가치가 필요한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