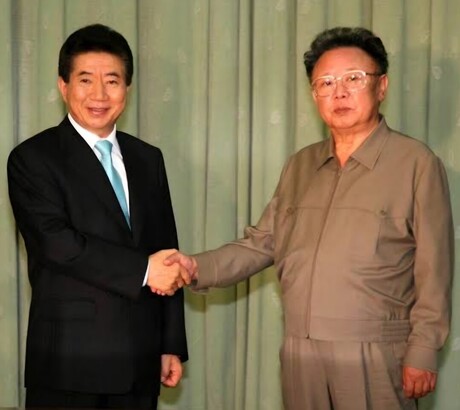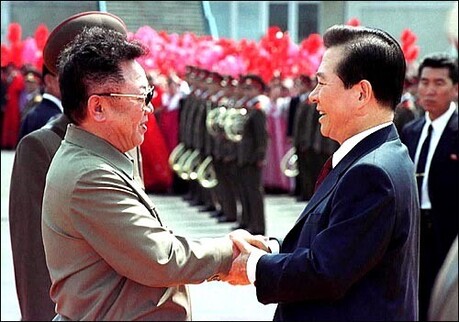-
 한국은 지난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무역규모 세계 9위.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내수경기와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급여는 낮아져 의류잡화점으로 향하는 고객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무역규모 세계 9위.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내수경기와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급여는 낮아져 의류잡화점으로 향하는 고객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명품시장은 수년째 국내 고객들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등 명품점에는 오늘도 경기의 등락폭에 무관한 상류층의 발걸음이 꾸준하다.
명품브랜드들은 국내 대형백화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토종브랜드의 절반도 안 되는 10~15%의 수수료만을 받으며 핵심자리에 자리잡았고 백화점 외부광고를 독차지했다. 최근 연이어 문을 여는 대형 명품 아울렛들은 일반 중산층에게도 할인된 가격으로(그러나 여전히 고가인) 명품 제품의 구매기회를 다양화하고 있다.
명품의 폭발적인 소비는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 등 급격히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 유수의 명품그룹들은 일제히 아시아, 태평양의 신흥시장에 대규모 점포를 열고 정작 자국의 점포수를 줄이고 있다.
외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가게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20% 이상 비싸다는 점을 발견한다. 신흥국에게는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매출은 대부분 고공행진이다.
명품이란 소유할 수 있던 없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듯하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한국에서의 명품은 계급을 드러낸다.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경제력 강한 사람이 높은 계급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명품의 구매는 경제력을 과시함으로서 자신의 계급을 드러내려는 의미로 보인다. 명품소비는 과시욕의 정점에 있다.
명품은 역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오랜 신뢰가 이어져야 한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과 세부적인 부분을 놓치지 장인정신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선진국에는 명품(MASTERPIECE)과 별도로 고가의 유명브랜드를 지칭하는 사치품(LUXURY)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두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널리 알려진 L사의 경우 150년이 넘는 역사와 고품질 여행용 가방만을 만들기 위한 몇 세대를 거친 장인정신으로 현 위치에 올랐으니 명품브랜드의 기준을 모두 갖췄다. 하지만 과연 명품이라는 인정받은 브랜드가치가 상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많은 명품 브랜드가 세계 각국에 오픈한 점포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수공예 방식 및 현지 소규모 생산으로는 상품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장형 대량 생산으로 제조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품질을 떠나 장인이 장기간에 걸쳐 노력해 만들어내던 그 전통과 역사성은 퇴색되고 있다. 국민들도 브랜드 이미지에만 현혹되지 않는 스마트한 쇼핑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2.01.13 (금) 16:41, 최종수정 2012.01.13 (금) 16:36
-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