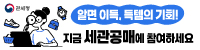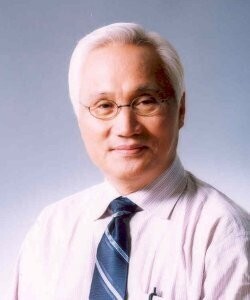 |
|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 |
지금 첨단과학이 창조한 것들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생겨 옛것은 물러나고 새 것이 각광을 받는 순환은 지구의 순환 시스템과 동일한 현상이다. 그래서 자연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는데 자연이 해결할 수 있는 량보다 많은 관계로 인간에게 습격을 하여 인간의 삶에 문제 아니 장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고 너 때문이야 하는 데도 너 너야 이런 생각과 행동 때문에 멸종위기의 고래가 하루에 1,000만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고래만은 아니고 사람도 그러하다. 지금 인간의 혈액 속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인간의 혈액 속에서 힘이 되어 그 힘으로 사는 지도 모를 정도이다.
과학이 첨단화되면서 생활이 편리한 것들이 쏱아져 나오면서 옛것은 그저 쓰레기로 버리는 현상은 어떤 나라를 가보면 서울처럼 버스가 82번 광나루 가는 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착각하게 여기도 한국인가 하고 이것이 동남아 국가들에서 착각하게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가면 아이들이 한국유치원생 처럼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은 정말 위대한 민국의 영향이 세계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의 리사이클이다.
물이 귀한 것인데 비가 오면 물은 귀하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폭우가 순간 오래 공드려 지은 집이 물이 떠내려가고 함께 가축도 그리고 노인도 모셔가는 심각한 현상이다.
비가와서 한강의 수문만 열면 엄청난 쓰레기는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데다 삼림이 우거져 나무까지 합치면 이거야말로 자연의 습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강에 실려 오는 쓰레기를 건져내어 전기에너지 연료로 시용하는 방법 등이지만 지속성이 아니라서 자연을 탓하고 있을 뿐이다.
태평양 북쪽에 거대한 섬이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섬처럼 생겨나서 항공사진 찍어 보니 쓰레기가 모여진 섬이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섬, 여객기에서도 큰 섬으로 보이는 물체의 섬은 순수하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류에 의해 그곳에 모여지고 있는 플라스틱 섬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해변으로 밀려와 산더미처럼 많은 각종 생활쓰레기가 모여 있어 해변에는 이름모를 쓰레기가 밀려와서 해변을 걸을 수 없는 장해물이 되었다. 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처리하지만 역부족, 쓰레기를 땅 파고 묻어도 한계를 넘어 더 이상 섬에 땅 파고 묻을 수 없는 한계가 훨씬 넘어 어쩔줄 모르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환경역습이 어느 정도인지 깜짝 놀래고 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의 해변에 6,7,8월에 해류에 밀어온 해초가 부패하는 악취로 인해 해변접근이 어려운 것을 1년에 한번 씩 당하고 있는 섬의 재해는 전통적으로 광생이 모자반자 이라고 하여 식용으로도 먹었던 역사적 근거이다. 현재는 그 시기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 와서 큰 문제가 매년 한 번씩 당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왠지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는 잡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형으로 첨단화되어 있어 많은 사료를 시용하고 있는 것 그자체도 해수의 질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다. 해변에는 이런 부산물과 더불어 인간의 생활페기물 등이 합쳐서 더 새로운 아니 환경역습에 섬사람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은 넓은 바다이니 뭐 시간이 약이 되겠지 하고 있는 것도 당연이 때가 되면 더 이상 해초는 안오고 오직 365일 생활쓰레기인 플라스틱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다.
아름다운 해변은 옛말, 악취와 플라스틱 그물과 함께 뒤범벅이 되어 아름다운 해변은 쓰레기 정글의 해변으로 변해 찾는 사람도 없다,
해초의 공격은 역사적인 것 인재요. 그 긴긴 세월동안 아무도 대책을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지자체 선출직 사람들은 무엇에 신경을 썻는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문제의 인식을 안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 인식 부족인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첨단과학시대라고 설치고 있는데, 그것 조류에 의해 밀려온 해초 처리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자체는 정말 그 냄새를 맞아 보지 않았다면 한번 맞아 보면 당장 정책을 세울 터인데 왜 그리 전동적으로 사는 정책인가요, 이재 GDP가 커졌으면 당연이 환경정리를 안해도 방이 물로 바람으로 되었기에 그래서 왜 돈드려 자연이 나아지는것이 해결하겠지 하는 명언을 남기려는 것 아닌가요.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은 항상 자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생활수준이 상승하면서 자연을 관리는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민감한 것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해변 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관리에 의한 탄생이므로 그래서 선조님들은 24절기로 나누어 감시하고 일해야 하는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라 한다면 관리자자들은 이에 순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은 항상 환경이 인간을 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이 주기적으로 해결해아 하는 것이 옛닐은 절기로 나누어 감시한 것이다. 이런 것은 변함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Moowoong Choi, Ph.D.) Konkuk University. 구리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위원장. 땅물빛바람연구소장.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