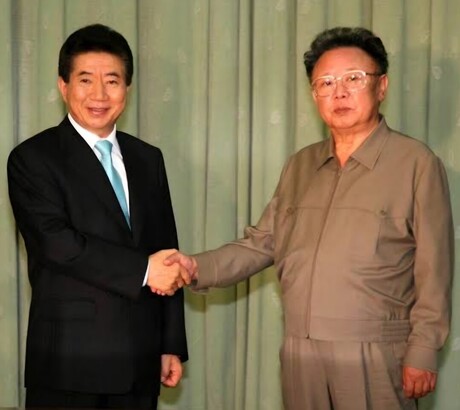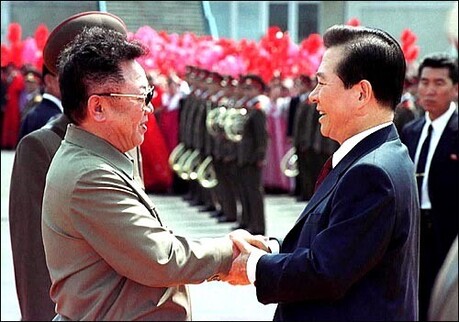칼럼 ‘인사청문회가 두렵다’를 게재한 후 지인께서, 자신이 보기에는 분명히 부끄러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입에 발린 말로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그 사람들을 인사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 역시 무서웠다. 그리고는 이내, 분명히 백성들이 선택한 정치인과 그들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왜 백성들이 무서워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화가 났다.
 |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현실 파악도 할 줄 모르면서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그들과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럴 때 가장 비교하기 좋은 역사상의 인물은 소현세자다.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군사들의 말발굽이 강토를 뒤덮고 있을 때였다. 청나라가 침입한 원인조차 모르는 조정에서는 그 원인을 헤아리고 현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오로지 명나라는 받들어야 하는 존재요 청나라는 오랑캐로 치부하면서 그저 도망치고 숨기에 바쁜 한편 전쟁은 당연히 백성들이 하는 것으로 밀어붙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하게 된 경위도 대책을 강구하거나 반격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강화도로 피하려고 했으나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청나라 선봉대가 너무 빨리 마포나루에 도착하는 바람에 배를 탈 수 없어서 일단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다음날 강화도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눈이 내린 뒤의 새벽길이 너무 미끄러워 말조차 거동하기 불편해 인조는 그냥 남한산성을 피신처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시 남한산성에 있던 식량은 산성 식구들이 50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런데도 남한산성에 머물렀다는 것은 전쟁이 50일 내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마저도 계산을 안 했던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일단 남한산성에 머무르며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기도 하고 각 지방에 파발마를 띄워 병사들이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있는 청나라 군사들을 격퇴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많은 원병이 오지도 못했지만, 그나마 지방에서 오는 원병들도 남한산성에 도착도 하기 전에 청나라 군사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조선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1627년에 정묘호란을 한 번 겪었다. 그리고 그 전에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강토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전쟁에 시달린 것은 백성들만이 아니다. 조국의 강토 역시 전쟁에 시달려 곡식을 심어도 피비린내를 이기지 못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자, 강토는 황폐해지고 흉년은 지속되었다. 왜놈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채 3년도 되지 않아 정묘호란을 맞았고, 그로부터 채 10년도 되지 않아 병자호란을 맞았다.
그나마 살아남은 백성들은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 전쟁을 극복했다. 조국을 위해서 내던지고 싶어도 내던질 것이 없는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었다. 그런 현실도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주전론과 주화론을 각기 외치며 파당 싸움에만 열을 올려 서로 정국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조정 대신들이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릴 리가 없었다.
백성들이 의병으로 와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나라 군사들을 물리쳐주기를 바라던 조정 대신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성안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그게 백성들의 덕분인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세자가 나와서 항복하라는 청나라의 요구에, 세자 스스로 ‘백성 없는 세자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며 나서려는 것을 차기 지존께서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고 하며 반대했고, 그 바람에 전세는 오히려 더 악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은 결국 인조가 삼전동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의 참혹한 항복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만일 그때 세자가 항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백성들의 현실은 파악도 못 하던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항복하러 가겠다고 나서던 소현세자가 그리운 까닭이다.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도리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하는 이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백성들은 자신이 선택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이상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백성들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려고 선택을 하건만 별로 달라진 것도 새로워진 것도 없이 오히려 실망만 가득할 뿐이다.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걸어야 할 정치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다는 인상만 짙게 드리운다. 여북하면 정치적인 노선에 상관하지 않고 넘나들며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까지 생길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무엇보다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시야가 백성들과 그네들 사이에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
부족한 능력은 참모가 채워줄 수 있지만, 부도덕한 정신은 참모가 바꿔줄 수 없는 것이 인간 삶의 기본이다. 기본을 무시해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성현께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