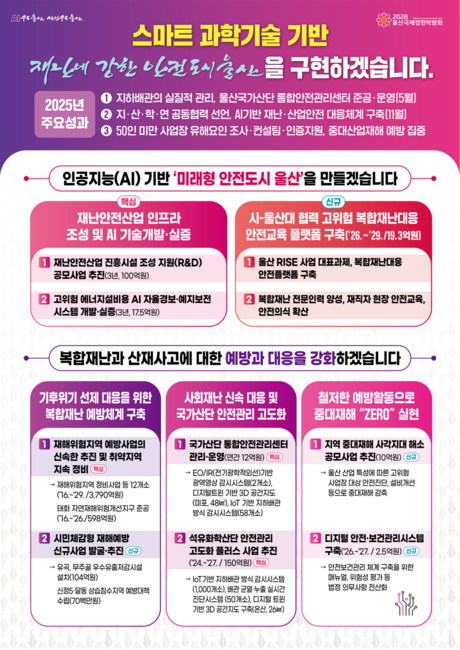[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선언하고 세부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3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 관련 향후 환경오염 문제 등 영향에 미칠 것을 대비 자체적으로 가정‧학교‧기업 등 서울시민의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처리기반 혁신을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는 감량혁신(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률 높여 쓰레기 발생량20% 감축)과 기반혁신(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 700톤/일 확충), 시민실천문화혁신(시민 주도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교육.홍보) 등 세 가지 혁신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면부터 전면 시행되는 서울시의 ‘반입량관리제’에 따른 25개 자치구에게는 또 하나의 밀착형 민원으로 과제를 안게 됐다.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는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는 다음년도 생활쓰레기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20,050원/톤)를 10% 감면해주고,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부득이 반입시에는 2배 이상의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 그대로 버려지는 종이,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 등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분리배출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대형 편의점 등과의 협력을 통한 90% 생활쓰레기 감량하고 호텔, 유통센터를 비롯해 연면적 1,000㎡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 약 2만개 소 분리배출 의무화했다.
기반혁신으론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 및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일 150톤), 타 지자체 공동이용(일 250톤),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 도입(일 300톤)을 통해 자체 소각능력을 ‘17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992년도 난지도 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1995년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 도입후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40%, 매립량 94%가 감축되고 있으나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184톤/일 발생하고 있다. 이 중 2,465톤/일은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9톤/일은 인천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0톤은 25개 자치구의 감량 의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생활쓰레기 감량여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토록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연면적 3만㎡이상의 사무실, 유통센터, 호텔 등 약 5,000여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연면적 1천㎡이상(2만개소)까지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분리배출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전문기관교육 및 정기교육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찾아가 재활용분리배출 이행실태 파악 및 분리요령을 지도하는 재활용 전문컨설턴트 200명을 양성‧배치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30%만 처리가능한 처리시설 5개소의 처리용량을 ‘18년 전량 공공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2개소를 증설해 안정적인 공공처리 기반을 갖춰 ’12년에 1일 3,301톤에서 ‘18년 2,318톤으로 30% 감량(’18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00만 수도권주민을 위한 필수생활기반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체 처리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등 25개 자치구, 시민과 힘을 쳐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실현해, 친환경적인 수도권매립지 관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강력한 감량정책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않아 개인간에 사업자 등 자치단체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 마찰이 예상돼 ‘수거 거부’ 등의 사태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