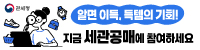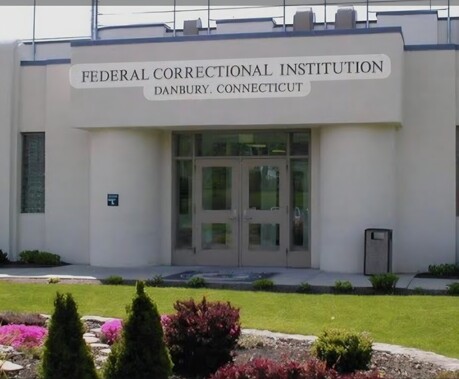|
| ▲안필응 대전시의원. |
나뭇잎도 다 떨어진 늦은 가을,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남겨진 ‘붉은 감’ 한 개.
늦은 가을,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고 날짐승을 위해 마지막 남은 감을 남겨놓은 흔히 까치밥이라 불리는 ‘감’ 하나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여유와 배려,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부모세대의 미풍양속.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동시에 이전부터 나눔과 감사의 계절이었다.
어릴 적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우리 조상들은 이웃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을 가진 민족이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우리 속담은 가을은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1년 중 먹을 것이 푸짐한 계절이기에 나온 말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계절은 먹고 살기가 그리 녹녹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치밥과 같은 미풍양속은 생활 전반에 퍼져있었고 나와 함께 남도 배려하고 위할 줄 아는 유전자가 계속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함께하는 문화가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핵가족사회를 넘어 이제는 급격한 1인 가구 증가로 혼자만의 생활문화가 늘어나고 고용시장 불안, 중산층의 붕괴,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협동, 배려, 여유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단순히 사회변화의 흐름으로 당연시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다음세대인 우리 자식들의 삶에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해답을 같이 고민해야 할 의무가 기성세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쟁으로 피폐된 국토와 국력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IMF를 겪게 됐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 금모으기 운동 등의 전개로 슬기롭게 IMF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려서 어려움이 왔다는 내‧외신의 보도에 위축되어 우리자신을 더욱 혹독히 다루기에 나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익은 홍익인간이란 고조선시대의 건국이념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풀이한 것을 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로 즉 ‘인간을 크게 도우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이념은 현재 1949년 교육법에서 시작해 1997년 교육기본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교육이념으로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고조선 건국이념부터 현재의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인 ‘인간을 크게 도우라(홍익인간)’를 통해 우리시대의 단절돼 가고 있는 배려와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정신을 되살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남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이 있었고 그것을 교육으로 이어왔기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하나 돼 다양한 교육과 문화행사, 사회계몽을 통해 풀어 나간다면 다함께 하나 되고 좀 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을은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이 결실을 맺고 수확과 함께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위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계절이다.
‘까치밥’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만 희망의 단어라는 생각이 문뜩 든다.
오늘 가까운 대학교 내 낙엽 길을 걷다가 한 가닥의 따스한 햇살이 내 몸과 낙엽을 비칠 때 참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조상의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의 미풍양속이 우리사회에 한 가닥 희망의 빛으로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