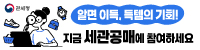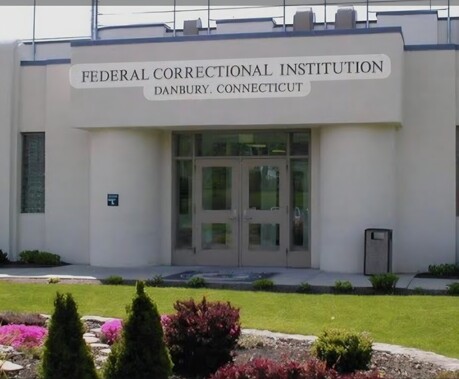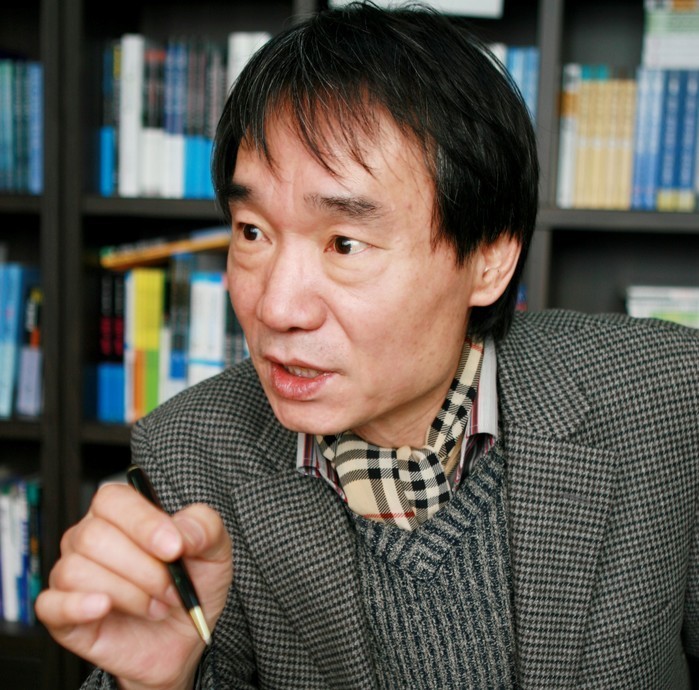 |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대고려국’은 만주에 있는 200만의 대한제국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1000만 명의 국가를 상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구성 민족에 대해서는 ‘대고려국’ 헌법 초안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5. 무릇 일본인 지나인 러시아인으로서 이미 고려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려국의 시민일 권리자격을 원하는 자는 차별 없이 이를 부여한다.”
방대한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만큼, 대한제국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본인은 물론 중국, 러시아인 등 만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다민족 국가로 건설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고려국’의 건국 주체는 대한제국의 유림들이며 구성 민족은 다민족이라고 했다. 그런 ‘대고려국’의 건국계획을 이끈 것은 대한제국의 양기탁을 비롯한 인물들과 일본의 스에나가 미사오 그리고 중국의 주사형(朱士衡)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대고려국’의 기반이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될 것임으로, 그중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은 양기탁(梁起鐸)과 정안립(鄭安立)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독립투사들이었다.
중국의 주사형은 중국 남방파 군벌로서 북방파 군벌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주의 독립을 선전하고 다녔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주가 독립하면 만주의 한민족도 독립된다는 것이다.
양기탁은 주사형의 계획이 만주에 거주하는 우리민족을 기반으로 한 독립국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 호응했다. 그리하여 정안립의 동삼성한족생계회와 연계하여 맹보순, 장진우 등과 함께 ‘대고려국’ 건국을 계획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간도로 대표되는 만주의 가장 많은 체류민이 대한제국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주사형은 양기탁과 정안립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대고려국’ 건국을 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인 스에나가 미사오 역시 ‘대고려국’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918년 12월 18일 경성 돈의동 장춘관에서 정안립, 맹보순, 이상규 등 80여명이 모여 고대사연구를 구실로 ‘대고려국’ 건국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발족한 ‘조선고사연구회’ 발기식에 주사형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인 1918년 3월 7일 정안립이 장우근과 일왕을 독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왕을 독대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실권자인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는 확실하게 만났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 때 야당당수인 도야마 미쓰루(頭山満)가 배석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안립이 일본 정계의 실권자와 민간주도 극우단체의 최고 실세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안립이 다짜고짜 그런 자리에 설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일본인 스에나가 미사오일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대고려국’ 건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전면에 나선 인물은 상기한 두 사람 정도이다.
반면에 대한제국에서는 양기탁을 필두로 정안립과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대거 ‘대고려국’ 건국에 열중한 것으로, 1921년 3월 31일자 대정일일신문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신문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 도와 해외 동포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시형과 정안립, 의병대장 이범윤, 홍범도를 비롯해서 이동녕, 조욱은 물론 상하이의 신규식, 신채호, 하와이의 이승만, 블라디보스토크의 김규식과 안창호는 물론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중칠 등 국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무려 백여 명에 가까운 애국지사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사들을 열거한 것은 설령 그분들이 적극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한제국 백성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대고려국’ 건국의 주체는 바로 대한제국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다. (제6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